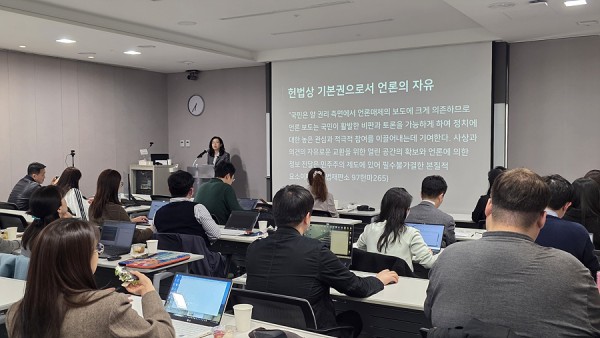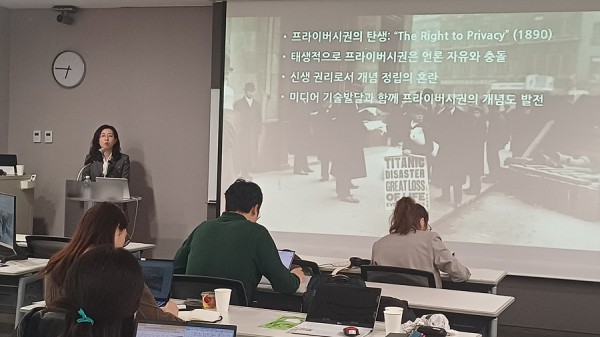언론인 교육
[언론현장의 법과 윤리2]박아란 고려대 교수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와 언론' 강의
2025.03.25
본문
‘프라이버시 침해’ 유명인 사생활 보도, 어디까지 허용될까
박아란 고려대 교수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와 언론' 강의
김혜란 더벨 기자
기자라면 종종 취재·보도 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보도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넘어 보도 후 기사 삭제 요청을 받기도 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기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기준이 필요하다.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교수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공인의 성범죄에 대해선 당연히 보도해야 하지만, 불륜이나 혼외자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면 언론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다"며 "(이런 보도는 많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절대 괜찮지 않은 보도"라고 했다.
<박아란 고려대 교수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삼성언론재단이 주최한 이날 '언론현장의 법과 윤리' 두 번째 강연에서 언론의 취재대상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들어 설명했다. 이날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방송사 기자 20여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고민을 나눴다.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의 사생활 관련 보도가 매일 쏟아지면서 언론이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영역, 결혼과 이혼 등 통상의 가족관계는 공개가 허용된다. 하지만 '남녀간의 성적교섭'에 관한 것은 사적 영역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박아란 고려대 교수가 프라이버시권의 탄생 배경과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전직 앵커의 혼외자 루머를 보도한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가 아닌 선정적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며 "'남녀간의 성적교섭'은 공인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마약 사건에 휘말린 배우의 불륜 의혹에 대해 보도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을 당했을 때 언론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마약 범죄는 취재·보도 대상이지만, 불륜 자체는 마약과 무관한 성적 교섭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적 사실 공표도 언론의 대표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다. 그는 "법원에서는 (언론이 공개한) 사적 사실이 보통 사람 입장에서 불쾌하게 여겨지는지를 판단한다"며 "만약 음성변조나 모자이크를 하기로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했다. 또 "권한 없이 남의 공간에 들어가면 사적 공간의 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며 "도청장치 부착, 망원렌즈 촬영도 경우에 따라 침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화 프라이버시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전쟁과 테러 같은 '비상한 공적관심사'에 관한 보도만 도청을 통한 보도를 허용한다. 박 교수는 "통화가 끝난 뒤 타인과의 대화를 엿들어 녹음해 보도한 경우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인으로선 아쉬운 판결이지만 사회 전체 이익을 생각할 때 대화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불법 도청이 판치고 대화 프라이버시가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자로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추후 통비법 위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도 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기사 삭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박 교수는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정정보도가 가능할 경우 기사 삭제를 불허한 대법원 판례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사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재벌 등 공인의 행적과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라면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다"며 "기자가 하는 일은 언론 자유의 가치가 있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문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된다. 잘못한 것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언론사 내에서 기사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내규를 정하고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조언했다. 관련 절차를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또 기사가 삭제됐으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한 줄 문장으로라도 남겨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후에는 정기적으로 삭제 기사 목록을 공개하거나 추후 심사를 하는 등 리뷰 과정이 필요하다.
박 교수는 "기자들은 정치인 등 전문 직업인의 거짓말에 대해 엄격하게 취재하고 비판하면서 본인이 행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선 '보도해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그만'이라고 지나가선 안 된다"며 "언론의 생명인 신뢰성 유지를 위해 공리주의적 가치 판단은 극히 조심스러워야 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언론사는 사기업임에도 공익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보호도 받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비판도 받는다"며 "(언론인이라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기본적 역할과 사회적 가치를 (미리) 고민해 보고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도 스스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 31일 저녁 6시 30분에는 '언론현장의 법과 윤리' 마지막 회인 '재난보도, AI 활용 등 윤리적 취재보도'에 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