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제표와 공시를 활용한 기사작성1] 매출, 자산, 비용의 세계 -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 첫 번째 강의
작성일 25.11.10
본문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 1강 - 매출, 자산, 비용의 세계
글: 곽소영 서울신문 기자
재무제표를 몰라도 기업의 실적 기사를 쓸 수 있다. 좋은 지표는 하나라도 더 홍보하고 싶은 기업과 복잡한 자료는 하나라도 덜 보고 싶은 기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이다. 어물쩡 쓴 기사를 보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기자 출신인 김수헌 MTN기업경제센터장이 강의 초입 “기사는 일기장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한 이유다. 기자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는 결국 팩트체크와 맞닿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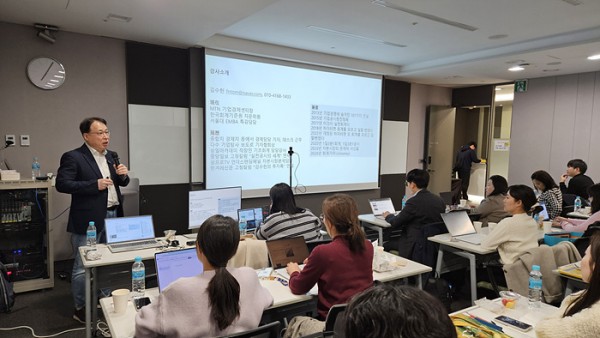
<김수헌 MTN 기업경제센터장이 기자들이 재무제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바른 기사를 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재무제표의 기본, 매출
김 센터장은 매출과 매출원가의 개념부터 설명했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매출로 인식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품이 이전됐을 때 재고의 주인은 누구인가’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사인 A사가 직영점에 제품을 납품했다면 직영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비로소 A사의 매출이 된다. 직영점의 화장품이 소비자에 판매되기 전까지는 A사의 재고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맹점의 경우엔 화장품을 공급하는 순간 가맹점의 재고이자 A사의 매출이 된다.
그렇다면 A사의 판매 서비스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위탁가맹점은 어떨까. 김 센터장은 “위탁가맹점은 말 그대로 판매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 재고의 주인은 여전히 A사”라며 “위탁가맹점에 공급해놓고 이를 매출로 기재하는 경우 분식회계가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표적인 분식회계의 예는 순액매출과 총액매출의 차이를 오기한 경우다. 의류업체인 B사가 백화점에 10만원짜리 옷 10개를 공급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옷 8개를 120만원에 판매하고 2개는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백화점이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옷 2개는 언제든지 B사에 반환할 수 있고, 거래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위탁판매 구조라면 백화점의 거래총액인 120만 원은 ‘총액매출’일 뿐이다.
백화점이 실제로 번 돈은 판매금액의 20%를 적용한 수수료 24만 원이고, 이를 ‘순액매출’이라고 한다. 남은 96만원은 B사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총액매출과 순액매출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매출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따진 뒤 일정 비율만큼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숲(아프리카TV) 두 회사의 회계 이슈가 총액매출과 순액매출 구분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총거래액일 뿐인 총액매출이 순액매출인 것처럼 둔갑하면 기업 가치가 대폭 커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 제조업의 매출 산정
매출과 매출원가, 영업이익 등 손익계산서 상의 주요 지표는 일반제조업, 유통업, 수주산업 등 업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다. 먼저 일반제조업에서 매출원가는 제조원가로, 재료비와 인건비, 감가상각비가 3대 요소다. 제조원가를 들여서 제품을 완성하면 재고자산이 된다.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분에 대해 매출이 생기고 다시 매출원가가 산정된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기업의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이때 제조원가 안에서도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고정비인 반면, 재료비는 변동비다. 공장 가동률에 따라 영업이익이 달라지는 이유가 고정비와 변동비의 차이에서 생긴다. 재료비 50만원, 인건비 20만원, 감가상각비 30만원을 들여 총 제조원가 100만원으로 반도체 10개를 생산했다고 가정하면 반도체 1개당 제조원가는 10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반도체를 5개 생산하는 데 드는 변동비인 재료비는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고 고정비인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는 그대로라 제조원가가 7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반도체 1개당 제조원가는 15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만약 반도체 1개당 판매가가 15만원이라면 가동률이 100%일 때는 10만원의 제조원가를 들여 15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5만원의 순이익이 생기지만, 가동률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가동률이 하락하면 기업의 손익 타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 센터장은 “특히 장치 산업들은 설비 투자가 크다 보니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가 많이 발생한다”며 “매출이 오르면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타격도 크게 받는 것이 장치 산업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김수헌 센터장의 강의를 들으며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수주산업의 매출 산정
조선·건설·방산 등 주문을 먼저 받은 뒤 제작을 시작하는 수주산업에서는 매출을 인식하는 과정이 다르다. 이들 산업은 수주를 받았을 때부터 실제 제작해 완성품을 납품할 때까지 시차가 생기기 때문이다. 수주 이후 중간 단계에서의 매출을 0원으로 잡을 경우 기업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그래서 수주산업의 매출은 완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회계를 기준으로 잡는다. 결산 때마다 진행률을 반영해 손익 산정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의 선박 건조 사업을 수주한 C사가 3년에 걸쳐 공사총예정원가 80억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한 해의 결산을 할 때마다 공사총예정원가 대비 투입된 공사원가의 비율로 진행률을 계산한다. 만약 1년만에 공사원가 40억 원이 투입됐다면 진행률은 50%가 되고, 이를 수주액 100억원에 반영해 공사매출은 50억원이 된다.
그런데 만약 결산 때 원자재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총예정원가가 90억원으로 늘었다면 공사진행률은 44%가 된다. 그렇다면 공사매출도 44억원으로 줄면서 손익 상태가 악화된다.
김 센터장은 “매출로 인식했다는 것은 판매가 되었다는 뜻으로, 실제로는 아직 선박이 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라도 회계적으로는 판매됐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라며 “납품 때까지 실적 반영이 유예되거나 재고가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공정 진행률에 따라 실적은 꾸준히 반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통업의 매출 산정
유통업의 경우엔 거래액과 순액매출 사이의 비즈니스적 착시를 유의해야 한다. 같은 유통 기업이라도 거래액, 즉 총액매출과 순액매출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업 가치를 잘못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수기를 10만원에 직매입해서 고객에게 12만원에 판매한 D사의 매출은 12만원이다. 반면 정수기를 12만원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판매 수수료를 10%만 떼어가는 E사의 매출은 1만 2,000원이다. 거래액은 12만원으로 동일한데도 매출만 두고 비교하면 D사가 E사보다 매출이 10배 많아지는 착시가 일어난 것이다.
김 센터장은 “비즈니스 구조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유통 기업을 비교할 때는 거래액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사람들이 어디서 몇 배나 더 물건을 많이 사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