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를 사로잡는 글쓰기1] 박재영 교수 '흡입력을 높이는 글쓰기 노하우' 강의
작성일 25.07.03
본문
기사는 말이 아니었다 — 장면으로 써야 비로소 읽힌다
박재영 교수 “말보다 장면, 기사도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글: 강미선 한국경제 TV 기자
“말보다 움직임, 기억에 남는 기사의 비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듯 습한 공기가 서서히 차오르던 7월 초, 광화문 스터디센터 강의실에는 각자의 노트북과 취재수첩을 들고 모여든 기자들로 자리가 꽉 찼다.
1년 차 신입기자부터 데스크급까지, 방송과 신문, 영자매 등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 다양한 매체에서 모인 30여 명의 기자들이 정갈하게 앉아 있었다. 기자들이 샌드위치를 다 먹어갈 때쯤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천천히 강의실 앞에 섰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그는 이날, ‘독자를 사로잡는 글쓰기’를 주제로 기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는 첫 문장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왜 당신의 기사는 끝까지 읽히지 않는가?” 그 질문에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사실 요즘 들어, 이 생각을 자주 했기 때문이다. 강의 설명에서 ‘단순 사례 나열’이 아니라 2·3회차 실습 수업까지 구성돼 있다는 점도, 망설임 없이 이 강좌를 신청한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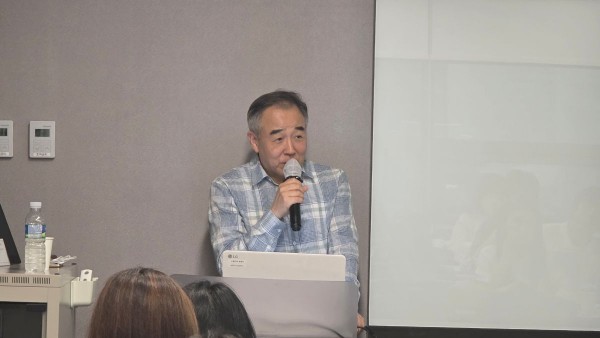
<박재영 고려대 교수가 사례 기사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모습이다>
“묘사, 설명, 인용… 순서를 바꿔라”
박 교수는 김예지 국회의원의 사과 현장을 다룬 두 기사를 비교했다. 하나는 인용문으로 가득했다. "사과드립니다", "정치권을 대표해…" 하지만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장면 중심이었다. 김 의원이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고, 지하철 계단 앞에서 멈춘 순간.
그림처럼 머릿속에 남았다. 박 교수는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움직임, 장면을 기억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말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왜 그동안 알면서도 외면했을까.
“‘그는 슬퍼 보였다’ 대신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교수는 기자들이 너무 쉽게 감정을 쓰고 있다고 했다. ‘슬퍼 보였다’, ‘당황한 듯했다’ 같은 문장들. 그건 기자의 해석이고, 독자에게 감정을 강요하는 말이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한 문장은 사실이고, 동시에 감정을 충분히 전달한다.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관찰보다 해석에 익숙했다. 판단을 자제하고, 말보다는 눈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기본을 다시 배웠다. “쌍따옴표를 너무 많이 쓰면 기사가 흐릿해집니다.” 박 교수의 이 말에, 그동안 취재원한테 들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
빽빽한 따옴표. 누구 말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많았던 문장들. 그는 강조했다. “쌍따옴표는 기자의 방패이자 함정입니다. 꼭 필요한 말에만 써야 독자도 집중합니다.” 그날 이후, 따옴표를 칠 때마다 두 번은 생각하게 됐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자를 사로잡는 글쓰기' 특강은 퇴근 후인 19시에 시작된다>
“뉴스(article)가 아닌 뉴스 스토리(story)”
“미국 기자들은 오늘 어떤 ‘스토리’를 쓸 거냐고 묻습니다.” 그는 리드를 쓸 때도 가장 강한 ‘화면’으로 시작하라고 했다. 생각해 보면 난 경제매체에 있다 보니 방송기사 쓸 때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꼭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독자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 그림이 있어야 마음이 붙는다. 그래야 많은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는 기사를 쓸 수 있구나. 하지만 한 편으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잘 데스킹 되어 출고가 가능할까 하는 막연한 고민이 들기도 했다.
2·3강은 실습 중심, 그래서 더 기대된다. 박 교수는 마지막에 다음 강의를 예고했다. 2강과 3강은 직접 묘사문 방식으로 기획 기사를 쓰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는 실습형 강의와 과제까지 줬다. 강의가 끝났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더 분주해졌다. 첫 기사에 나온 무릎 꿇은 김예지 의원의 표정보다, 내가 쓴 마지막 기사 첫 문장을 떠올렸다. 말뿐인 리드였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끄러웠다.
마치며 6년 차가 된 지금, 어쩌면 글을 ‘쓸 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강의는 내가 놓치고 있던 본질을 다시 떠올리게 해줬다. 지금 이 수강후기를 쓰면서도 쌍따옴표를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다. 말을 쓰는 기자에서, 장면을 기록하는 기자로. 앞으로의 강의에서 내 손끝이 어떻게 달라질지 솔직히 조금은 두렵지만, 그보다 훨씬 기대가 크다.
- 이전글[독자를 사로잡는 글쓰기2] '모범기사 사례와 기획 기사 다시 쓰기' 박재영 교수 강의 25.07.09
- 다음글[탐사·심층기획보도의 모든 것2] '사례로 배우는 탐사·심층기획보도' 유대근 기자 강의 25.06.26
